[동문칼럼] 엄마
하태돈
2012.04.10 09:56
2,652
0
본문
이제는 고아라고 해야 하겠지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벌써 삼월이 지나가니 사 주기가 되네요.
20대 초반에 떠나와 자식 노릇도 못하고,
사업이라고 한답시고 서울에 가도 밤이 늦도록 돌아다니다가
막내아들 걱정에 소파에 누워 잠드신 노모를 안스럽게
쳐다 보기만 했지요.
시간 좀 내서 맛있는 식당에라도 찾아서 오손도손 옛이야기도 하고
애들 커가는 얘기도 해 가면서,
잘 모르는 연속극이지만 고부간 갈등에 시어머니 편도 좀 들어주는 척
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다 후회스러운 세월들 뿐입니다.
‘지금이 그 때’라는 글을 쓴 일이 있는데 없어졌어요.
다시 그 기분이 들면 다시 잘 써봐야 겠습니다.
엄마라는 말은 사실 신경숙 보다는 우리 하씨가 더
원조 이지요.
칠십이 넘은 큰 딸도 언제나 엄마였구요, 그러고보니 벌써 오래전에
작고하신 작은 아버지(하인두 화백)도 할머니보고 엄마라고 했네요.
왠지 어머니라는 말이 그렇게도 어색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감상적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가 봅니다.
집사람이 어느 빵집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다가
세 명이서 다 훌쩍거렸답니다. 남세스럽게도..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다를 것이 없지요.
그런들 어떤가요. 슬퍼지면 울면 되는 것을.
살아 계실 때 잘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도 흔해서
별로 실감이 안가나요.
그래도 참으로 세겨서 들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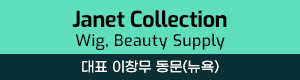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