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칼럼] 가장 성실한 글
본문
| |
 | 학자들은 가장 성실한 글로, 남을 의식하고 헛말을 할 까닭이 없는 絶緣狀(절연장)과 遺書(유서)를 꼽는다 |
| 張良守 |
 |
윌리엄 와트라는 미국의 문장이론가는 좋은 글이 되려면 성실성(sincerity)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성실한 글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불성실한 글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다. 그것은 마음에 없는 글, 읽는 사람에게 자기를 유식하고 사려 깊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쓴 글, 허세를 부린 글이다. 그런 글에 대한, ‘타인 指向(지향)의 글’ 또는 ‘선생님 보이려고 쓴 글’이라는 지칭도 그래서 생긴 것일 것이다. 애교로 보아야겠지만,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 쓴 작문을 보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자오락을 하는 것 보다 책을 읽는 것이 더 재미있더라고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이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성실성이 없는 글이 좋은 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분명한 이치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쓴 글에 뜻밖에도 명문이 많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글이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학자들은, 가장 성실한 글은 絶緣狀(절연장)과 遺書(유서)라고 하고 있다. 둘 다 다시는 그 글을 읽는 사람을 상면할 일이 없는 사람이 쓴 것이니까 거기에 남을 의식하고 헛말을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절연장의 경우, 이제 그 사람을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너, 아무 날 나한테 뭐라고 했니? 내, 그때는 참고 아무 말 안 했지만 인간이 그러면 못 쓴다” 이런 식이다. 사납기는 해도 성실성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젊은 날 직장의 일로 유서를 읽을 기회가 자주 있었다. 그 중 한 경우는 유서라기보다 한 바닥의 일기로,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 해 추석날, 남들은 다 즐겁다는 그 명절이 그 아버지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을 안겨주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중학생이 쓴 것이었다. 사람은 자신의 일기는 누구에게도 보이려 하지 않지만 그런 글도 가상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다고 한다. 그 독자가 자신이 믿는 神(신)이든, 다음에 읽을 자신이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일기를 쓸 때도 글씨를 곱게 쓰려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엄밀하게 보면 얼마간의 꾸밈, 가식이 있기 쉽다. 죽기 전날까지의 그 애의 일기도 그렇게 쓰여 있었다. 일기는 전형적인 깔끔한 성격의 여학생의 그것으로, 작고 예쁘장한 글씨가 표준말로, 정서법에 맞게, 정연하게 쓰여 있었다. 그런데 유서의 성격을 띠면서 글은 갑자기 그 전의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고르지 않은 큰 글씨가 어지럽게 날려 쓰여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고운 글씨도, 맞춤법도, 표준말도 개의하지 않고 있었다. “내만 보면 웃던 아버지, 내만 보면 뭐 사 주꼬, 뭐 먹을래 하던 아버지, 아버지 오데 갔소. 오늘은 추석 명절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데 갔소. 와 죽었소.” 글씨는 곳곳이 물기에 번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애가 그 글을 쓰면서 울어 눈물이 떨어져 그렇게 된 것 같았다. 다른 한 경우는 아주 짤막한 유서로, 그래서 더욱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 부산 반송동에 살던, 열다섯 살에서 여덟 살 사이의 세 자매가 자살을 했다.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에 얹혀 눈칫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슬퍼, 큰 애가 하느님과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동생들을 꾀어 함께 죽은 것이다. 그들은 각각 한 장 씩의 유서를 남겼는데,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던 둘째 애의 글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었다. “언니가 엄마·아빠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해서 간다. 한복이 아깝다. 보조가방이 아깝다.” 이것이 全文(전문)이었다. 한 소녀가 가난 속에서 어렵게 얻은 고운 옷 한 벌과 예쁜 가방 한 개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해 했던가가, 각박하고 고달팠지만 그래도 인생을 얼마나 사랑했던가가 눈에 선했다. 나는 지금도 그 글을 생각하면 목이 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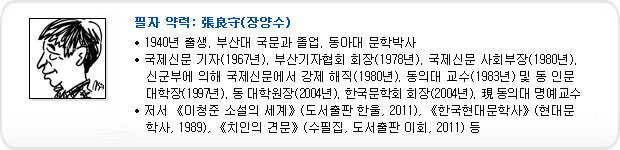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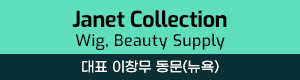

댓글목록 1
Admi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