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우의여정] <연재소설>여정(13회)
김시우
2007.03.13 01:37
3,644
5
-
- 첨부파일 : BO_105_헬기.jpg (80.0K) - 다운로드
본문

" 타타타타타타...."
B0-105 헬기에 실려 화곡동 국군 통합병원으로 이송중인 달수가 게슴치레 눈을 떴다. 군의관 박우철 중위와, 부대에서 보긴 했으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위생병이 식은 땀을 흘리며 각각 닝겔병과 혈액이 담긴 비닐 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 형님! 저, 우철입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인턴쉽을 수료한 후, 성남 문무대에서 기본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달수의 대대 군의관으로 부임하여 온 우철과 달수는 관사 위 아래층에 살면서 끈적한 여름밤, 고향 생각이 나면 부대 근처 마을 포장마차에서 만나 오뎅국물에 소주를 기울이며 호형호제하는 막역한 사이다.
달수가 칼이 꽂힌 옆구리의 심한 통증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 곳으로 손을 가져가자 자 우철이 제지했다.
“ 형님, 안됩니다. 아직 칼이 꽂혀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요.”
“ 우철아...나… 나, 너무 아파, 어, 얼마나 가야 되는거야, 나, 나 좀 어떻해 해줘…, 너무 아파서 숨도 못 쉬겠어. 좀... 좀더 강한.... 진통제 없냐? 그.... 그리고 왼쪽 다리가 붙어있는 거야? 왜 이렇게 다리가... 다리가 이렇게 아프냐? ”
“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그만 깜빡하고…”
부대에 부임을 하여 이 같은 대형 사고를 처음 당해 닝겔병에 주사할 진통제를 챙기지 못한 우철이 입술이 바짝 말라 하얗게 타버린 달수를 내려다 보며, 비오듯 쏟아지는 이마의 땀을 훔치며 울먹거린다.
헬리곱터 소음에 달수의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가 잘 안들리자 우철이 고개를 기울여 그의 귀를 달수의 입에 가져갔다.
“ 우철아…저…저기…조종사한테… 아도르핀 주사가 … 있을거야, 좀… 달라고 해”
“ 아, 안됩니다 형님, 잘못하면 돌아가십니다.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으 어어엉~”
아드로핀 주사는 화생방전시 독가스에 중독되어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덜어주기 위한 휴대용 주사기이다. 극한 상황에서만 사용이 허가되고 2번이상의 주사는 환자가 쇼크로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화생방전 교육시간에 반드시 배우는 기본이다. 달수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우철이 피말리는 통증을 견디지 못해 절규하며 죽어가는 사람앞에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감과 자괴심에 목놓아 운다.
다시 정신을 놓아버린 달수의 귀에는 우철의 울음소리가 헬리콥터의 엔진 소음에 묻혀 사라지고, 아버지의 음성이 프로펠러의 소음을 밀고 점차 크게 들려왔다.
“ 그래, 넌 다친 데 없냐? .”
넥타이를 가다듬는 달수 아버지가 뒤에서 학교가방을 들고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는 달수를 거울을 통해 보면서 말을 건냈다.
“ 예, 아버지…”
“ 그 친구는 얼마나 다쳤냐?”
“ 코뼈하고 앞이 3개가 부러졌어요”
“ 뭐?... 3개씩이나 ? ”
달수 아버지가 놀라 달수를 돌아보자 달수가 고개를 숙인다. 그가 진정하고 다시 묻는다.
“ 그래, 분명히 대한기업 최돈식 회장이라고 했냐 ? ”
“ 네…”
( “ 내 참! 그 양반을 이렇게 만나네.”)
“근데 아버지, 왜 정복을 안 입고 양복을 입으세요? 아버지, 정복이 더 멋있던데...”
항상 정복만을 입는 아버지가 사복을 챙겨 입자 달수가 이상하여 물었다. 달수 아버지는 사적인 만남에 신분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또한 고위 경찰간부 신분으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싫었을 것이다.
“ 잔말 말고, 너 학교 갔다가 어디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들어와, 알았어? ”
달수 아버지가 눈알을 돌리며 뭔가를 곰곰히 생각하다 현관문을 열고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검정 관용차로 향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뭐라고 넌지시 지시하니 그가 혼자 차를 몰아 사라졌다.
“제가 김달수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드님이 많이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치료비 일체를 부담하겠습니다. 아뭏튼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푸스 호텔의 일식집 ‘정향’ 에서 민규의 아버지를 마주한 달수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 무슨 말씀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더 잘못이 많습니다. 제가 뵙자고 한 것은 아들대신 사과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교장선생님과 애들 앞에서 아들을 두둔할 수도, 그렇다고 달수를 두둔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
“ 제가 민규 애미와 헤어진 후 재혼을 하자, 민규가 반항적으로 되어 ‘오냐 오냐’ 키웠더니 저렇게 안하무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민규의 아버지는 워커힐 호텔의 디너쇼에 참석했다가 유명 듀엣 펄 시스터즈의 한 명과 눈이 맞아 전처와 이혼을 하고 그녀와 재혼을 했다는 것은 이미 메스컴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 그래서 이 번 기회에 달수 아버님께서 아들을 당당하게 키운 노하우도 배우고 싶기도 하구요, 민규와 달수가 친구가
되어 서로 좋은 점을 닮아가게 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좋은 점?)”
싸움의 발단을 들어 잘 알고 있는 달수 아버지는 달수와 민규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각각의 성격의 가졌슴을 이미 알고 있었다.
“ 무슨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지 심성이 저렇게 타고난 것을요. 그리고 우리 달수와 아드님이 친구가 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저희 부모가 좌지우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대한기업 최돈식입니다. ”
최회장이 명함을 꺼내 달수의 아버지에게 건네자 그는 모서리가 금박으로 둘러쌓인 화려한 명함을 두손으로 정중히 받아 읽어본 뒤 수첩에 끼워 넣으며 자신 것도 꺼내 최회장에게 건냈다.
“ 아니? 인천 지방경찰청 정보국장이십니까? 아이고! 김 경무관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이거 황송합니다. 곧 치안감으로 승진하시면 차기 청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서울 경찰청장 내무부 장관까지 고속승진 할 것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차기 총리감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
"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뵐까 싶었는데, 경무관님께서 워낙 청렴결백하신 분이라고 들어서 괜한 오해를 불러올까 망설였었습니다. 제가 뵙자고 한 것이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허참 이거야…”
“………”
“ 얼마전 밀곡 밀수사건에 우리 대한기업이 관여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인천 경찰청 정보국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우린 그 사건에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암튼 제가 인덕이 부족해서 헛소문에 연류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헛소문?)…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최회장님이 자진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해명하는 것도…, 그것은 제 부하 직원이 고등학교 후배인 기자와의 사적인 대화가 기사화된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우리 정보국에 대한 유감을 여러 차례 언급하시더군요.”
“ 그거야…저기…”
“그 기자 회견후 청장님 지시로 제 부하 직원은 징계조치 되었고, 그 기자는 경찰청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아직 내사중인 사건을 발설한 제 부하직원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부하직원을 단속하지 못한 제 책임도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
“ (아직 내사중?)…, 아, 그러문요, 그 까짓 걸 가지고…그리고 이것은…제 아들의 경거망동에 대한 사과의 표시입니다.”
“이게 뭡니까?”
최회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 식탁위에 놓고 서명을 하고 주위를 두리번 거린 후 김 경무관 가까이 밀어놓았다. 최회장이 김 경무관에게 건넨 것은 김 경무관도 말로만 듣던 인생을 바꾼다는 백지 수표였다. 김 경무관이 잠시 수표를 내려다 본 뒤 발끈한다.
“ 최회장님 저를 어떻게 보고 이러시는 겁니까? 국민과 가족에게 부끄러운 짓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서 집어 넣으십시요, 사람들이 보면 큰일납니다.”
“ 경무관님! 이건 그저…”
“ 글쎄 이러시면 안된다니까요… 그리고 달수를 전학시키던지 아드님을 전학시키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만…”
김 경무관은 단호한 어조로 최회장의 말을 끊고 일어서 식당 문을 나섰다. 이제 막 도미회를 한 사발 가지고 주방에서 미소를 짓고 나오는 일식조리사가 도미회라면 사족을 못쓰는 김 경무관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을 보고 고개를 꺄우뚱 거렸다.
한참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최회장의 눈가에 경련이 일고, 수표를 잡아 구기는 그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 네 이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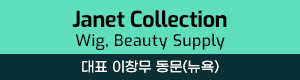

댓글목록 5
윤성한님의 댓글
한국이든 미국이든 꼭 한번 뵙고 싶네요...
김시우님의 댓글
그때 미리 연락함세. 자네 아직도 서울대 수자원 연구실에 있는 거 맞지? <br />
내 메일로 근황도 알려주게나. <br />
<br />
P.S. 그리고 다른 동네에 왔으면 신고해야지, 몇 학번 무슨 과 등등 <br />
미주 동문들이 새로운 이름을 보면 많이 궁금해들 하지, 반갑거든...^^
길동돼랑님의 댓글
방가.....^^
박명근님의 댓글
작가분의 아버님께서 관련 분야에 계셨다니<br />
아주 비슷하게 전개 되는것 같습니다<br />
<br />
이젠 조금씩 그림이 그려 지는데 <br />
그래도 결론은 아직....
김시우님의 댓글
물 한 컵 마시고 그냥 침대로 돌아갈까 하다가 책상에 앉았습니다.<br />
<br />
반갑게도 제 글에 댓글이 올라왔다는 빨간 숫자가 보이더군요.<br />
이 작지만 큰 정성으로 인해 '누군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br />
<br />
선배님, 건강하십시요.<br />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