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칼럼] <추억여행>남성 컴플렉스(6회)
김시우
2007.02.28 12:04
2,388
0
본문
난 지금도 망해도 그만이라는 어쩌면 가벼운 생각을하고 산다. 어차피 미국은 빈손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쉽게 포기한다고 말을 듣기도 하지만 이것 저것 도전해 보는 것이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젠 소위 통밥으로 척 보면 '이건 안되는 것'인 줄 알고 몇 만불의 손해를 보았더라도 손을 놓는다.
돌아보니 인생 참으로 짧다. 영화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아내와 같이 음악회도 자주 가고, 아내를 위한 요리도
자주 하고 싶다. 내가 일본식당 사업에 관심이 있어 일본요리를 배울 때 아내는 ‘내가 해준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했는데 그걸 5년동안 못해주고 있었다.
그보다 더 오래 전,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해 일주일 동안 분을 참으려고 끊었던 술을 다시 입에 대고 취한 나머지
이성을 잃었었다. 권총을 집어 들고 집을 나설때 아내는 내 다리를 잡고 통곡을 하며 ‘ 당신, 한국에 돌아간다고 할 때 내가 잡지 않았다면 이런 수모를 안 당했으니 나 부터 죽이라’ 고 했다.
밖으로 나서지 못한 내가 총구를 내 머리에 가져가자 아내는 남자의 내 힘으로도 뿌리칠 수 없는 힘으로 내 손을 잡고 총을 자신의 머리에 댔다. 내가 총을 놓고 울면서 안은 그녀의 가슴의 강하고 빠르게 뛰던 심장은 지금도 나의 눈물을 자아낸다. 나는 지금도 어깨가 결려 주물러 달라고 하면 감도 오지 않는 힘없는 그 손에서 어떻게 그렇게 강한 힘이 나왔었는지 의문스럽다. 그게 나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힘 닿는데 까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사회단체 활동보다는 음지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다.
내가 인수했던 개스 스테이션에 미국 손님이 항상 같은 시간에 찾아 왔었다. 그리고 10여분을 떠들다 간다.
내가 나중에 궁금하여 물어보니 내가 가게에 있는 시간에 일부러 온다는 것이다.
자신의 말을 미소만 짓고 웃어주는 사람이 내가 유일했던 것이다. 매일 같은 유머를 듣는 내가 지루함을 숨기고
겸연쩍어 웃는 것인데, 그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되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타고 다니는 고급 캐딜락 보다는,
와싱턴 호수 근처의 저택보다는, 친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아내, 그 한 사람에게 만이라도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
센프란시스코에서 씨애틀에 여행을 왔다가 그곳에는 없는 우거진 숲과 온화한 날씨에 반해 정착한지 5년이
넘어가는데, 매일 보고 지나다니는 스페이스 니들을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 뭐하고 사는 것인지, 무엇때문에
사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다.
사업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분쟁이 생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것도 모두 중단시켰다.
변호사는 '다 이긴 것을 왜 중단하냐' 며 잘못하면 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책상에 비슴듬히 걸터 기대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어깨를 들어올리는 변호사를 뒤로 한 채 나는 말했다. " I don't care !"
사업은 춘추전국시대의 왕조같이 흥망을 넘나든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도 여한이 없다. 또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에서 생성된 재산은 모두 아내및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 져도 잃을 것도 없지만 만일
모든 것을 잃는다 하여도 잠시 빌려쓴 것, 제 주인 찾아 돌려 보냈다는 마음을 갖기로 했다. 그것은 손실이 아니다.
송사에 휘말려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및 개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더 큰 손실이다.
최근에 구입했던 개스 스케이션도 동업자와 경영개념 차이로 4개월만에 처분했다. 6만불의 손실이 생겼다.
이 6만불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다 잊어버리기 했다. 돈이 아깝지만 이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다. 가만이 있으면
불안한 일중독에 빠져,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전력을 투구하지 못하면서도 이것 저것 벌려놓은 잡다한 사업같지 않은
사업을 다 정리했다. 그리고 나니 이제 아내밖에 보이지 않는다. 허상에 가려 실상을 보지 못하고 살었던 날들을
돌아보며 회한의 한숨을 쉬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당장 아내를 데리고 스페니스 니들에 올라 시애틀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에서
근사한 식사를 할 것이다. 죽지 않을 만큼 아파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계룡산에 올라가 도를 닦지 않아도
절로 득도하니 말이다. 잡아도 잡아도 도망가는 나의 40대는 어느 덧 고개를 차고 올랐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쉽게 포기한다고 말을 듣기도 하지만 이것 저것 도전해 보는 것이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젠 소위 통밥으로 척 보면 '이건 안되는 것'인 줄 알고 몇 만불의 손해를 보았더라도 손을 놓는다.
돌아보니 인생 참으로 짧다. 영화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아내와 같이 음악회도 자주 가고, 아내를 위한 요리도
자주 하고 싶다. 내가 일본식당 사업에 관심이 있어 일본요리를 배울 때 아내는 ‘내가 해준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했는데 그걸 5년동안 못해주고 있었다.
그보다 더 오래 전,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해 일주일 동안 분을 참으려고 끊었던 술을 다시 입에 대고 취한 나머지
이성을 잃었었다. 권총을 집어 들고 집을 나설때 아내는 내 다리를 잡고 통곡을 하며 ‘ 당신, 한국에 돌아간다고 할 때 내가 잡지 않았다면 이런 수모를 안 당했으니 나 부터 죽이라’ 고 했다.
밖으로 나서지 못한 내가 총구를 내 머리에 가져가자 아내는 남자의 내 힘으로도 뿌리칠 수 없는 힘으로 내 손을 잡고 총을 자신의 머리에 댔다. 내가 총을 놓고 울면서 안은 그녀의 가슴의 강하고 빠르게 뛰던 심장은 지금도 나의 눈물을 자아낸다. 나는 지금도 어깨가 결려 주물러 달라고 하면 감도 오지 않는 힘없는 그 손에서 어떻게 그렇게 강한 힘이 나왔었는지 의문스럽다. 그게 나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힘 닿는데 까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사회단체 활동보다는 음지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다.
내가 인수했던 개스 스테이션에 미국 손님이 항상 같은 시간에 찾아 왔었다. 그리고 10여분을 떠들다 간다.
내가 나중에 궁금하여 물어보니 내가 가게에 있는 시간에 일부러 온다는 것이다.
자신의 말을 미소만 짓고 웃어주는 사람이 내가 유일했던 것이다. 매일 같은 유머를 듣는 내가 지루함을 숨기고
겸연쩍어 웃는 것인데, 그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되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타고 다니는 고급 캐딜락 보다는,
와싱턴 호수 근처의 저택보다는, 친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아내, 그 한 사람에게 만이라도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
센프란시스코에서 씨애틀에 여행을 왔다가 그곳에는 없는 우거진 숲과 온화한 날씨에 반해 정착한지 5년이
넘어가는데, 매일 보고 지나다니는 스페이스 니들을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 뭐하고 사는 것인지, 무엇때문에
사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다.
사업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분쟁이 생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것도 모두 중단시켰다.
변호사는 '다 이긴 것을 왜 중단하냐' 며 잘못하면 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책상에 비슴듬히 걸터 기대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어깨를 들어올리는 변호사를 뒤로 한 채 나는 말했다. " I don't care !"
사업은 춘추전국시대의 왕조같이 흥망을 넘나든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도 여한이 없다. 또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에서 생성된 재산은 모두 아내및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 져도 잃을 것도 없지만 만일
모든 것을 잃는다 하여도 잠시 빌려쓴 것, 제 주인 찾아 돌려 보냈다는 마음을 갖기로 했다. 그것은 손실이 아니다.
송사에 휘말려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및 개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더 큰 손실이다.
최근에 구입했던 개스 스케이션도 동업자와 경영개념 차이로 4개월만에 처분했다. 6만불의 손실이 생겼다.
이 6만불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다 잊어버리기 했다. 돈이 아깝지만 이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다. 가만이 있으면
불안한 일중독에 빠져,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전력을 투구하지 못하면서도 이것 저것 벌려놓은 잡다한 사업같지 않은
사업을 다 정리했다. 그리고 나니 이제 아내밖에 보이지 않는다. 허상에 가려 실상을 보지 못하고 살었던 날들을
돌아보며 회한의 한숨을 쉬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당장 아내를 데리고 스페니스 니들에 올라 시애틀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에서
근사한 식사를 할 것이다. 죽지 않을 만큼 아파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계룡산에 올라가 도를 닦지 않아도
절로 득도하니 말이다. 잡아도 잡아도 도망가는 나의 40대는 어느 덧 고개를 차고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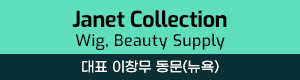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