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우의여정] <연재소설>여정(11회)
김시우
2007.03.02 05:16
2,551
2
본문
“ 너, 도시락을 두 개 가져왔냐? 하긴 그 덩치에 하나로는 안되… 어?...햐~ 이게 뭐야, 소시지 부침이네,
거기다 게맛살까지.”
민규가 도시락 두 개를 열자 그의 짝꿍인 이상돈이 탄성을 지른다. 그러자 주위에서 옹기 종기 모여 도시락을 까먹던
다른 급우들의 시선이 적어도 6가지의 반찬이 가지런히 널려있는, 자신들의 도시락보다 큰 인규의 반찬통에 꽂힌다.
“ 얌마, 이게 소시지가 아니고 스팸이란 미제 햄인데 난 인제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 파출부 아줌마 메뉴가 바뀌지도
않아.”
인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급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민규의 도시락 반찬통에 젖가락을 꽂는다. 순식간에 계란
햄부침은 1개만 남았다. 아직도 그 한 개를 쟁취하기 위해 급우들이 민규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 잠깐, 내가 이걸 공중에 던질 테니 입으로 받아서 먹어, 입으로 받은 사람에게 내가 여기 맛살과 치즈를 다 준다.
오늘은 영 입맛이 없네, 쩝...”
민규가 햄을 허공에 던지자 맨 뒤에 있던 최봉규가 앞에 있던 아이들을 밀치고 입으로 받으려 하는데, 하필 햄이
쫙 벌린 그의 입이 아닌 뺨을 때리고 이내 마루 바닥에 떨어졌다. 급우들의 시선이 잠시 바닥의 햄에 쏠렸다가
최봉규의 얼굴을 화난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쭈빗 쭈빗 서로 눈치를 살피다가 일제히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으려 하는데 최봉규가 한 발 빨랐다.
“ 햐~ 꿀맛이네 쩝쩝…”
“ 개만도 못한 놈들… 근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쇄끼는 더 나쁜 놈이야.”
교실 가운데 중간쯤에 앉아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던 달수의 이 한 마디에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급우들보다 10센티미터 가량 키가 더 크고 피둥 피둥 살이 올라 제법 몸집도 일반 성인남자 못지 않은 민규의 면전에서
그 동안 그를 힐난하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달 전쯤 민규가 전학을 오기전 옆반의 학생이
놀러왔다가 너무 떠드는 것을 본 달수가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여 시비가 붙었으나, 그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달수의 돌려차기에 바닥에 누운 것을 기억하는 급우들은 민규와 달수의 피할 수 없는 일전이 불 보듯 자명하였다.
“ 뭐라 그랬어? 이 새꺄, 한 번 더 말해봐”
민규가 벌떡 일어나 달수에 다가가서 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후려치자 달수의 입에서 씹던 밥알들이 튀어나와
앞에 앉아 밥을 먹던 강태훈의 뒤통수에 품어졌다. 태훈이 목과 교복 깃 안으로 기어들어간 밥풀과 씹다남은 김치
조가리를 손으로 끌어잡어 보이며 민규를 째려봤다.
태훈이는 키가 작고 땅땅한 체격에 민규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작았지만 민규도 만만하게 대하지 못하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권투부 선수였다. 그의 종아리는 어른 주먹보다 큰 알통이 있어 급우들 허벅지만큼 두꺼웠다.
장난치다가 맞는 그의 주먹은 골이 울리도록 육중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두손을 마주 밀어 상대의 발이 바닥
에서 떨어지게 하는 게임에서 태훈이는 한 번도 져 본적이 없다.
민규가 태훈이를 보고 잠시 멈칫하다가 '한 번 더 지껄여 보란 말야, 이 새꺄.' 라고 소리치며 한 번 더 달수의 튀통수를
치려는 순간, 달수의 두 손이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달수의 엉덩이가 의자에서 약 30cm 정도 위로 뜨는가 싶더니
그의 오른 다리가 대각선으로 허공을 가르고 민규의 왼턱에 작렬했다.
“ 퍽… 우당탕… 꽈당”
“ 어후~… 이 쇄끼 좀 봐라 ”
민규가 몇 발자국 뒤로 밀리다가 책상 위로 자빠지더니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다. 민규가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 달수를 향해 주먹을 쥐고 돌진하는 것을 본 달수는 두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했다.
민규가 앉아있는 달수를 오른 발로 걷어차려는 순간, 달수가 왼 손으로 바닥을 짚는가 싶더니 그의 오른 다리가
바닥 위 10cm 정도 떠서 반원을 그리면서 바닥을 짚고 있는 민규의 왼 발목을 강타한다. 민규는 밑둥이 잘린 통나무가
엎어지듯 고꾸라지며 마루바닥에 얼굴을 박더니 움직임이 없다. 민규도 다소 당황한 눈빛이다.
최봉규를 위시한 민규의 꼬붕들이 민규에게 달려다 일으켜 세우자 그의 코와 입에서 끈적 끈적한 선혈이 낭자하다.
손바닥 넓이의 긴 나무를 서로 겹치게 하여 만들어진 마루 바닥중 한 칸이 뿌러져 함몰되었고, 그 마루가 뿌러지면서
만들어진 가시가 민규의 코등에 몇 개 박혀있었다. 거기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차마 눈 뜨고 보지못할 형상이었다.
마루바닥에는 피가 뭍은 민규의 앞니 3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잘게 씹다 뱉은 떡볶이 모양...
“ 그래도 그렇지 마, 사람을 어떻게 그리 만들어 놓냐? 그 놈 얼굴에다 검정칠만 하면 완전히 아프리카 흑인이다,
코하고 입술이 퉁퉁 부어 까뒤집어져 가지고 … (아주 아작을 내지 그랬냐? ) ”
“ 선생님 그건 정당방위였다구요, 글코 이빨 부러진 것은 내가 방어공격하다가 민규 지가 넘어져서 그런거구요.”
달수의 담임 정구태가 좌우의 다른 선생들을 살피고 내심을 숨기면서 마음과 달리 교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는 달수의 머리를 출석부로 한 대 내리치며 혼을 내자 달수가 항변한다. 그 때 전화통을 내려놓는 교감선생님이
달수 담임선생에게 다가와 ‘정선생 큰 일 났어, 하며 자기를 따라 오라고 했다. 달수 담임 역시 민규의 버르장머리를
알고 있어지만 학교 육성회장이며 실세의 정치인들과도 가까운 재벌의 아들이란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교감선생의 뒤를 따라 교장실로 들어간 달수 담임은, 침통한 표정으로 창 밖을 내다보며 허리에 뒷짐을 짚고, 똥마린
강아지 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이는 구창걸 교장과 눈이 마주치자,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모른다.
“ 이것 봐요, 정선생, 이거 어떻해 할거야? 최회장 아들을 저렇게 뭉그러뜨려 놨으니 최회장이 가만 있겠냐고?...
거기다 대한제분이 매해 수 천만원씩 기부하던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동안 적자재정을 메울 자금줄이 끊기는
거란 말야. 나와 당신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야. ”
“ 교장샌님, 재벌기업 최회장이 아무렴 그깟 사적인 일 가지고 기부금을 중단하겠심꺼? 그게 다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건디…”
바른 말 할때는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달수 담임 정구태 선생에게 교장이 고함을 지른다.
“ 정 선생 분필 놓고 싶어요?.”
“ 아, 아니 전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
“ 시끄러워요. 어? 저기 회장님 들어오신다. 자, 자, 우리 나가서 맞읍시다.
학교 정문을 통해 검정 세단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교장이 양복의 단추를 채운다.
쯧쯧쯧 ( “ 으이그, 칠칠한 놈, 그 덩치에 맞고 다녀? ”)
교장의 인도로 양호실을 찾은 최회장은 민규의 얼굴을 보고 혀를 찼다. 마침 기절하였다 깨어나 침상에 누워있는
민규는 최회장을 보자 후다닥 담요로 얼굴을 덮었다.
“ 달수야 네 입장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나를 봐서라도 무조건 잘못 했다고 해, 알았지? 그게 우리가 살길이다.
공립학교 같지 않아 너 퇴학당하고, 나 모가지 날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냐. 난 아직도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어,
민규 아버지 한마디면 재단 이사장님도 어쩔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
교무실에서 민규를 데리고 최회장이 기다리고 있는 교장실로 향하는 달수의 담임 정구태가 달수에게 신신당부한다.
“ 사람을 때린 것은 잘못했지만 그건 어디까지 정당방위였고, 급우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먼저 공격을 한 것은
민규였습니다.”
사태에 대해 묻는 최회장에게 달수는 또박 또박 싸움에 발단에 대해 설명했다.
“저는 밥 한톨만 남겨도 농사를 한 농부를 생각해보라는 아버님의 꾸중의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민규는…”
“ 그만 못해!”
최회장에게 자리를 내어준 교장이 달수의 말을 끊고 안절부절 못한다. 나란히 앉은 교감이 달수 담임선생의 옆구리를
찌르고 이어서 달수 담임선생이 달수의 옆구리를 찌르는데도 달수는 눈 하나 깜짝않고, 최회장의 눈을 바라보고 2시간
전 벌어진 싸움의 발단에 대하여 또박또박 이야기를 이어갔다. 교장이 이젠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며 최회장에게 당부한다.
“ 회장님, 제발 재단 이사장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요, 저 이제 정년퇴직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제발…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 교장 선생님,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네,
김달수라고 했나? 네 부모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 ”
“ .........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나 제 부모님을 뵙자고 하면 응당 그래야겠지만, 아저씨께서 제 부모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오! 마이 갓) 야, 야, 김달수! 아, 아저씨가 뭐냐? 회장님 이라고 해야지~이.”
최회장이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교장은 최회장의 눈치를 잠깐 살핀 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 좋아, 그럼…교장 선생님, 제가 저 학생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겠습니까? ”
거기다 게맛살까지.”
민규가 도시락 두 개를 열자 그의 짝꿍인 이상돈이 탄성을 지른다. 그러자 주위에서 옹기 종기 모여 도시락을 까먹던
다른 급우들의 시선이 적어도 6가지의 반찬이 가지런히 널려있는, 자신들의 도시락보다 큰 인규의 반찬통에 꽂힌다.
“ 얌마, 이게 소시지가 아니고 스팸이란 미제 햄인데 난 인제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 파출부 아줌마 메뉴가 바뀌지도
않아.”
인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급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민규의 도시락 반찬통에 젖가락을 꽂는다. 순식간에 계란
햄부침은 1개만 남았다. 아직도 그 한 개를 쟁취하기 위해 급우들이 민규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 잠깐, 내가 이걸 공중에 던질 테니 입으로 받아서 먹어, 입으로 받은 사람에게 내가 여기 맛살과 치즈를 다 준다.
오늘은 영 입맛이 없네, 쩝...”
민규가 햄을 허공에 던지자 맨 뒤에 있던 최봉규가 앞에 있던 아이들을 밀치고 입으로 받으려 하는데, 하필 햄이
쫙 벌린 그의 입이 아닌 뺨을 때리고 이내 마루 바닥에 떨어졌다. 급우들의 시선이 잠시 바닥의 햄에 쏠렸다가
최봉규의 얼굴을 화난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쭈빗 쭈빗 서로 눈치를 살피다가 일제히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으려 하는데 최봉규가 한 발 빨랐다.
“ 햐~ 꿀맛이네 쩝쩝…”
“ 개만도 못한 놈들… 근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쇄끼는 더 나쁜 놈이야.”
교실 가운데 중간쯤에 앉아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던 달수의 이 한 마디에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급우들보다 10센티미터 가량 키가 더 크고 피둥 피둥 살이 올라 제법 몸집도 일반 성인남자 못지 않은 민규의 면전에서
그 동안 그를 힐난하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달 전쯤 민규가 전학을 오기전 옆반의 학생이
놀러왔다가 너무 떠드는 것을 본 달수가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여 시비가 붙었으나, 그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달수의 돌려차기에 바닥에 누운 것을 기억하는 급우들은 민규와 달수의 피할 수 없는 일전이 불 보듯 자명하였다.
“ 뭐라 그랬어? 이 새꺄, 한 번 더 말해봐”
민규가 벌떡 일어나 달수에 다가가서 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후려치자 달수의 입에서 씹던 밥알들이 튀어나와
앞에 앉아 밥을 먹던 강태훈의 뒤통수에 품어졌다. 태훈이 목과 교복 깃 안으로 기어들어간 밥풀과 씹다남은 김치
조가리를 손으로 끌어잡어 보이며 민규를 째려봤다.
태훈이는 키가 작고 땅땅한 체격에 민규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작았지만 민규도 만만하게 대하지 못하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권투부 선수였다. 그의 종아리는 어른 주먹보다 큰 알통이 있어 급우들 허벅지만큼 두꺼웠다.
장난치다가 맞는 그의 주먹은 골이 울리도록 육중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두손을 마주 밀어 상대의 발이 바닥
에서 떨어지게 하는 게임에서 태훈이는 한 번도 져 본적이 없다.
민규가 태훈이를 보고 잠시 멈칫하다가 '한 번 더 지껄여 보란 말야, 이 새꺄.' 라고 소리치며 한 번 더 달수의 튀통수를
치려는 순간, 달수의 두 손이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달수의 엉덩이가 의자에서 약 30cm 정도 위로 뜨는가 싶더니
그의 오른 다리가 대각선으로 허공을 가르고 민규의 왼턱에 작렬했다.
“ 퍽… 우당탕… 꽈당”
“ 어후~… 이 쇄끼 좀 봐라 ”
민규가 몇 발자국 뒤로 밀리다가 책상 위로 자빠지더니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다. 민규가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 달수를 향해 주먹을 쥐고 돌진하는 것을 본 달수는 두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했다.
민규가 앉아있는 달수를 오른 발로 걷어차려는 순간, 달수가 왼 손으로 바닥을 짚는가 싶더니 그의 오른 다리가
바닥 위 10cm 정도 떠서 반원을 그리면서 바닥을 짚고 있는 민규의 왼 발목을 강타한다. 민규는 밑둥이 잘린 통나무가
엎어지듯 고꾸라지며 마루바닥에 얼굴을 박더니 움직임이 없다. 민규도 다소 당황한 눈빛이다.
최봉규를 위시한 민규의 꼬붕들이 민규에게 달려다 일으켜 세우자 그의 코와 입에서 끈적 끈적한 선혈이 낭자하다.
손바닥 넓이의 긴 나무를 서로 겹치게 하여 만들어진 마루 바닥중 한 칸이 뿌러져 함몰되었고, 그 마루가 뿌러지면서
만들어진 가시가 민규의 코등에 몇 개 박혀있었다. 거기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차마 눈 뜨고 보지못할 형상이었다.
마루바닥에는 피가 뭍은 민규의 앞니 3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잘게 씹다 뱉은 떡볶이 모양...
“ 그래도 그렇지 마, 사람을 어떻게 그리 만들어 놓냐? 그 놈 얼굴에다 검정칠만 하면 완전히 아프리카 흑인이다,
코하고 입술이 퉁퉁 부어 까뒤집어져 가지고 … (아주 아작을 내지 그랬냐? ) ”
“ 선생님 그건 정당방위였다구요, 글코 이빨 부러진 것은 내가 방어공격하다가 민규 지가 넘어져서 그런거구요.”
달수의 담임 정구태가 좌우의 다른 선생들을 살피고 내심을 숨기면서 마음과 달리 교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는 달수의 머리를 출석부로 한 대 내리치며 혼을 내자 달수가 항변한다. 그 때 전화통을 내려놓는 교감선생님이
달수 담임선생에게 다가와 ‘정선생 큰 일 났어, 하며 자기를 따라 오라고 했다. 달수 담임 역시 민규의 버르장머리를
알고 있어지만 학교 육성회장이며 실세의 정치인들과도 가까운 재벌의 아들이란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교감선생의 뒤를 따라 교장실로 들어간 달수 담임은, 침통한 표정으로 창 밖을 내다보며 허리에 뒷짐을 짚고, 똥마린
강아지 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이는 구창걸 교장과 눈이 마주치자,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모른다.
“ 이것 봐요, 정선생, 이거 어떻해 할거야? 최회장 아들을 저렇게 뭉그러뜨려 놨으니 최회장이 가만 있겠냐고?...
거기다 대한제분이 매해 수 천만원씩 기부하던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동안 적자재정을 메울 자금줄이 끊기는
거란 말야. 나와 당신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야. ”
“ 교장샌님, 재벌기업 최회장이 아무렴 그깟 사적인 일 가지고 기부금을 중단하겠심꺼? 그게 다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건디…”
바른 말 할때는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달수 담임 정구태 선생에게 교장이 고함을 지른다.
“ 정 선생 분필 놓고 싶어요?.”
“ 아, 아니 전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
“ 시끄러워요. 어? 저기 회장님 들어오신다. 자, 자, 우리 나가서 맞읍시다.
학교 정문을 통해 검정 세단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교장이 양복의 단추를 채운다.
쯧쯧쯧 ( “ 으이그, 칠칠한 놈, 그 덩치에 맞고 다녀? ”)
교장의 인도로 양호실을 찾은 최회장은 민규의 얼굴을 보고 혀를 찼다. 마침 기절하였다 깨어나 침상에 누워있는
민규는 최회장을 보자 후다닥 담요로 얼굴을 덮었다.
“ 달수야 네 입장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나를 봐서라도 무조건 잘못 했다고 해, 알았지? 그게 우리가 살길이다.
공립학교 같지 않아 너 퇴학당하고, 나 모가지 날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냐. 난 아직도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어,
민규 아버지 한마디면 재단 이사장님도 어쩔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
교무실에서 민규를 데리고 최회장이 기다리고 있는 교장실로 향하는 달수의 담임 정구태가 달수에게 신신당부한다.
“ 사람을 때린 것은 잘못했지만 그건 어디까지 정당방위였고, 급우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먼저 공격을 한 것은
민규였습니다.”
사태에 대해 묻는 최회장에게 달수는 또박 또박 싸움에 발단에 대해 설명했다.
“저는 밥 한톨만 남겨도 농사를 한 농부를 생각해보라는 아버님의 꾸중의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민규는…”
“ 그만 못해!”
최회장에게 자리를 내어준 교장이 달수의 말을 끊고 안절부절 못한다. 나란히 앉은 교감이 달수 담임선생의 옆구리를
찌르고 이어서 달수 담임선생이 달수의 옆구리를 찌르는데도 달수는 눈 하나 깜짝않고, 최회장의 눈을 바라보고 2시간
전 벌어진 싸움의 발단에 대하여 또박또박 이야기를 이어갔다. 교장이 이젠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며 최회장에게 당부한다.
“ 회장님, 제발 재단 이사장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요, 저 이제 정년퇴직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제발…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 교장 선생님,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네,
김달수라고 했나? 네 부모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 ”
“ .........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나 제 부모님을 뵙자고 하면 응당 그래야겠지만, 아저씨께서 제 부모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오! 마이 갓) 야, 야, 김달수! 아, 아저씨가 뭐냐? 회장님 이라고 해야지~이.”
최회장이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교장은 최회장의 눈치를 잠깐 살핀 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 좋아, 그럼…교장 선생님, 제가 저 학생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겠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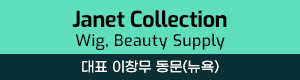

댓글목록 2
박명근님의 댓글
이제 분위기가 대충 들어 옵니다<br />
<br />
삼성 이건희 회장님도 연속극이나 스토리 보시면서 다음 어떻게 전개되나를 계열사 사장들과 얘기 한다던데<br />
우리도 그래 볼거나?<br />
다음은 어떻게 전개 될까요<br />
마지막까지 잘 되도록 힘 내게 격려의 박수를 짝짝짝~~~
김시우님의 댓글
가끔 지치기도 하지만 참여해주시면 더욱 감사하는 마음에 분발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