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우의여정] <연재소설>여정(41회)
김시우
2007.11.25 18:14
2,999
3
본문
전날의 과음이었을까. 달수는 여전히 침대에 옹크리고 이불 봉오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던 달수가 갑자기 이불을 박차고 침대 한 켠에 걸터앉았다. 정신이 조금 들자마자 바로 떠오른 것은 갈증으로 바짝 타버린 입을 적시는 일보다 희정의 음성이었다.
아직도 희정의 음성은 달수의 귓전에 머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창문의 커튼을 열어 젖기자 날카로운 유리의 파편처럼 그의 눈을 찌르는 늦은 아침의 햇살에 달수는 눈살을 찌뿌렸다. 창문 너머로 어제 새벽 늦게까지 머물렀던 빌딩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제서야 달수는 어제 테헤란로 있는 롯데 호텔 룸바에서 맡겨놓은 양주를 다 비우고 또 한 병을 시켜 그 마저 다 비우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이 호텔에 침대에 뉘여졌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달수가 몇 걸음 옮겨 거실에 있는 테이블의 전화수화기를 들었다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다시 놓아버렸다.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들은 달수가 뚜껑을 비틀어 열고 물을 마시다 사레가 들린 것처럼 한참을 컥컥거리다 쇼파에 주저 앉았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에 놓인 아이보리 색 전화기에 가 있었다.
“ 접니다. 김달수…”
“ ………”
달수의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말이 없다. 달수 역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꺼낸 말이 죄송하다는 것이었다. 살면서 누구에게 대뜸 사과를 할 만큼 잘못을 저지르고 살지 않은 달수였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존심이 강한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한 대상은 부모님 이외에는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마주앉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싶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가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걷어내고 싶을 따름입니다.”
“………”
이제 와서 그 이상의 무엇을 제가 바라겠습니까. 한 때 가슴에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었던 희정씨와 차 한 잔을 사이에 주고 마주하고 싶은 내 마음을 그다지도 이해 못한단 말입니까…”
달수는 희정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수화기에는 적막감이 돌았다. 달수는 희정이 전화를 끓은 것 같아 ‘여보세요’를 수 차례 외쳤다. 그래도 희정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달수는 낙심하여 천천히 수화기 귀에서 떼려는 순간 희정이 말했다.
“ 점심시간에 딱 30분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어요.”
달수는 뛸 듯이 기뻤다. 침대 옆의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는 양복 상의에 주머니에 넥타이를 쑤셔넣고 꼬깃 꼬깃한 맨 셔츠차림으로 호텔의 이용실을 찾아나섰다. 엘리베이터와 로비를 바쁘게 걸어가는, 마치 막 정사를 끝낸 사람의 모습을 달수의 헝클어진 모습을 투숙객들이 힐끗거렸다.
“ 몹시도 급했던 모양이야. 마누라한테 들키기라도 한 걸까?”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제 갈 길만을 걸어가는 달수와 비껴 지나가는 중년 커플 중 남자가 달수의 뒷모습을 돌아보며 이죽거리며 말하자, 그의 옆의 여자가 남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볍게 때리며 의미 모를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이용실에 들어서 거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은 달수는 그의 눈이 퉁퉁 부어 있슴을 그제서야 알아차렸다. 과음에다 엎드려 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달수는 이전보다 더 조바심이 났다. 앞으로 희정을 만나기로 한 시간이 고작 1시간 조금 넘게 남아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 그의 눈의 붓기가 빠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저… 머리 손질은 조금 있다가 하고 얼음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 얼음은 없구요… 뭐에 쓰시려구요, 냉장고에 찬 물수건이 있는데,.”
식당도 아닌 이발소에서 얼음을 찾는 달수를 이발사가 이상하게 쳐다보며 물었다. 이발사의 고개짓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호리 호리하지만 풍만한 가슴 골을 깊이 파인 옷으로 드러낸 여자 면도사가 냉장고에서 물수건을 가져다 달수에게 건네주면 말했다.
“ 면도하고 안마 좀 해드릴까요?”
“ 아닙니다. 머리 손질은 조금있다 하고 잠시 누워있어도 되겠죠?”
의자를 뒤로 제끼고 찬 물수건으로 눈에 덮고 잠자듯 누워있는 달수를 이발사와 면도사가 서로를 쳐다보면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 와중에 면도사는 달수의 팔을 잡고 안마를 할 듯이 주므르며 애교를 떨었다.
호텔에 투숙했던 손님들이 머리를 자르기보다는 간단한 손질과 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이발보다는 면도와 안마가 주수입원이라는 것을 달수는 잘 알았지만 그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간단히 머리 손질을 받은 달수는 면도사가 양복 상의를 뒤에서 받쳐주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만원짜리 3장을 주고 그곳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호텔 정문에서 벨보이의 안내로 택시를 오른 달수는 엉덩이를 들어 바지 뒷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 만원짜리 한 장을 벨보이에게 건넸다. 늘 있는 생활의 한 부분이었지만 어디서나 친절을 가장한 돈을 벌기 위한 행태에 달수는 갑자기 짜증이 났다.
달수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룸 밀러를 통해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관찰하다 기사와 눈이 마주치자 멋적어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10여분 정도 지나서 희정과 약속한 빌딩의 일부가 눈에 들어오자 달수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 얼마나 기다렸던 세월인가.”
달수는 미터기의 금액만큼 요금을 꺼내들면서 그 짧은 순간에 처음 희정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지금 이 순간이 마치 희정과 그 오래전 만남의 연속선 상에 있는 것 처럼 느껴졌다. 달수는 기도했다. 그러한 자신의 감정이 희정에게도 얼마만큼은 남아 있었기를…
택시에서 내려 희정과 약속한 장소로 달수가 발길을 옮기면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12시 15분 약속시간보다 15분 빨리 도착했지만 달수는 주저하지 않고 빌딩의 지하에 위치한 카레에 들어섰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마자 달수의 고개는 희정을 찾아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희정은 도착하지 않았고 생각보다 너무 어둡고 소란스런 카페의 분위기에 달수는 다시 그곳을 나왔다. 희정이 도착하면 다른 곳을 가자고 할 생각이었다.
달수가 초조한 마음에 카페의 입구에서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려고 손에 들린 라이터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어깨가 딱 벌어진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달수에게 다가왔다.
“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김달수씨 맞죠?”
아직도 희정의 음성은 달수의 귓전에 머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창문의 커튼을 열어 젖기자 날카로운 유리의 파편처럼 그의 눈을 찌르는 늦은 아침의 햇살에 달수는 눈살을 찌뿌렸다. 창문 너머로 어제 새벽 늦게까지 머물렀던 빌딩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제서야 달수는 어제 테헤란로 있는 롯데 호텔 룸바에서 맡겨놓은 양주를 다 비우고 또 한 병을 시켜 그 마저 다 비우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이 호텔에 침대에 뉘여졌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달수가 몇 걸음 옮겨 거실에 있는 테이블의 전화수화기를 들었다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다시 놓아버렸다.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들은 달수가 뚜껑을 비틀어 열고 물을 마시다 사레가 들린 것처럼 한참을 컥컥거리다 쇼파에 주저 앉았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에 놓인 아이보리 색 전화기에 가 있었다.
“ 접니다. 김달수…”
“ ………”
달수의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말이 없다. 달수 역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꺼낸 말이 죄송하다는 것이었다. 살면서 누구에게 대뜸 사과를 할 만큼 잘못을 저지르고 살지 않은 달수였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존심이 강한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한 대상은 부모님 이외에는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마주앉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싶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가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걷어내고 싶을 따름입니다.”
“………”
이제 와서 그 이상의 무엇을 제가 바라겠습니까. 한 때 가슴에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었던 희정씨와 차 한 잔을 사이에 주고 마주하고 싶은 내 마음을 그다지도 이해 못한단 말입니까…”
달수는 희정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수화기에는 적막감이 돌았다. 달수는 희정이 전화를 끓은 것 같아 ‘여보세요’를 수 차례 외쳤다. 그래도 희정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달수는 낙심하여 천천히 수화기 귀에서 떼려는 순간 희정이 말했다.
“ 점심시간에 딱 30분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어요.”
달수는 뛸 듯이 기뻤다. 침대 옆의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는 양복 상의에 주머니에 넥타이를 쑤셔넣고 꼬깃 꼬깃한 맨 셔츠차림으로 호텔의 이용실을 찾아나섰다. 엘리베이터와 로비를 바쁘게 걸어가는, 마치 막 정사를 끝낸 사람의 모습을 달수의 헝클어진 모습을 투숙객들이 힐끗거렸다.
“ 몹시도 급했던 모양이야. 마누라한테 들키기라도 한 걸까?”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제 갈 길만을 걸어가는 달수와 비껴 지나가는 중년 커플 중 남자가 달수의 뒷모습을 돌아보며 이죽거리며 말하자, 그의 옆의 여자가 남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볍게 때리며 의미 모를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이용실에 들어서 거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은 달수는 그의 눈이 퉁퉁 부어 있슴을 그제서야 알아차렸다. 과음에다 엎드려 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달수는 이전보다 더 조바심이 났다. 앞으로 희정을 만나기로 한 시간이 고작 1시간 조금 넘게 남아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 그의 눈의 붓기가 빠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저… 머리 손질은 조금 있다가 하고 얼음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 얼음은 없구요… 뭐에 쓰시려구요, 냉장고에 찬 물수건이 있는데,.”
식당도 아닌 이발소에서 얼음을 찾는 달수를 이발사가 이상하게 쳐다보며 물었다. 이발사의 고개짓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호리 호리하지만 풍만한 가슴 골을 깊이 파인 옷으로 드러낸 여자 면도사가 냉장고에서 물수건을 가져다 달수에게 건네주면 말했다.
“ 면도하고 안마 좀 해드릴까요?”
“ 아닙니다. 머리 손질은 조금있다 하고 잠시 누워있어도 되겠죠?”
의자를 뒤로 제끼고 찬 물수건으로 눈에 덮고 잠자듯 누워있는 달수를 이발사와 면도사가 서로를 쳐다보면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 와중에 면도사는 달수의 팔을 잡고 안마를 할 듯이 주므르며 애교를 떨었다.
호텔에 투숙했던 손님들이 머리를 자르기보다는 간단한 손질과 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이발보다는 면도와 안마가 주수입원이라는 것을 달수는 잘 알았지만 그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간단히 머리 손질을 받은 달수는 면도사가 양복 상의를 뒤에서 받쳐주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만원짜리 3장을 주고 그곳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호텔 정문에서 벨보이의 안내로 택시를 오른 달수는 엉덩이를 들어 바지 뒷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 만원짜리 한 장을 벨보이에게 건넸다. 늘 있는 생활의 한 부분이었지만 어디서나 친절을 가장한 돈을 벌기 위한 행태에 달수는 갑자기 짜증이 났다.
달수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룸 밀러를 통해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관찰하다 기사와 눈이 마주치자 멋적어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10여분 정도 지나서 희정과 약속한 빌딩의 일부가 눈에 들어오자 달수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 얼마나 기다렸던 세월인가.”
달수는 미터기의 금액만큼 요금을 꺼내들면서 그 짧은 순간에 처음 희정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지금 이 순간이 마치 희정과 그 오래전 만남의 연속선 상에 있는 것 처럼 느껴졌다. 달수는 기도했다. 그러한 자신의 감정이 희정에게도 얼마만큼은 남아 있었기를…
택시에서 내려 희정과 약속한 장소로 달수가 발길을 옮기면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12시 15분 약속시간보다 15분 빨리 도착했지만 달수는 주저하지 않고 빌딩의 지하에 위치한 카레에 들어섰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마자 달수의 고개는 희정을 찾아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희정은 도착하지 않았고 생각보다 너무 어둡고 소란스런 카페의 분위기에 달수는 다시 그곳을 나왔다. 희정이 도착하면 다른 곳을 가자고 할 생각이었다.
달수가 초조한 마음에 카페의 입구에서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려고 손에 들린 라이터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어깨가 딱 벌어진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달수에게 다가왔다.
“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김달수씨 맞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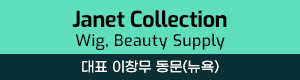

댓글목록 3
정창주님의 댓글
최강일님의 댓글
다시 열독하겠습니다~~
김시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