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 나는 내 병과 싸우기로 했다, 그리고 기적이…
admin
2010.09.22 07:48
2,362
1
본문
ESSAY] 나는 내 병과 싸우기로 했다, 그리고 기적이…
전범석·서울대병원 신경과장
기사100자평(14)
입력 : 2010.09.20 23:30
▲ 전범석·서울대병원 신경과장
등산 가다 갑자기 쓰러졌다… 전신마비였다
친척·동료의 문병을 거부했다…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회복 위해 내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마음자세였다
"내가 중환자실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만일 살아서 나가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되는 게 아닐까?" 전신마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었다. 단지 오른쪽 엄지발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병원 병실을 돌며 환자를 진료하던 내가 옴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죽을 때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2004년 6월, 그날 나는 남한산성에 등산 갔다가 갑자기 앞으로 푹 쓰러졌다. 순간적으로 졸도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저혈압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것일까?" 몸을 추슬러 일어나려고 했지만 척추를 다쳤는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헬기부터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함께 등산하던 후배에게 휴대폰으로 119와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달라고 부탁했다. 섣불리 들것에 실려 산길을 내려가다간 더 다칠까 두려웠다. 등산이든, 교통사고든 쉽게 다칠 수 있고 위험한 부위가 바로 목뼈이기 때문이었다.
중환자실로 실려온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길까"하고 생각했다. "등산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라고 후회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우선 병과 싸우는 게 급선무였다.
▲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burbuck@chosun.com
동료들은 곧 좋아질 것처럼 위로해 주었지만, 의사인 나는 이 싸움이 한두 달 아니 몇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직감했다. 우선 친구와 동료들의 문병을 받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고 결심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마음자세였다.
부모님께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외국에 연수 갔다"고 둘러대고, 가족들도 내 뒷바라지에 힘들지 않도록 따로 간병인을 구하였다.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었다. 나 자신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나, 가족이 힘들어 하는 것은 내가 도울 수 없는 게 아닌가.
다행스럽게도 나는 내 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내 전공이었다. 앞으로 잘못되면 장애가 평생 남을 수도, 어쩌면 휠체어에 평생 의지하며 살지도 모른다. 작은 실수 하나가 회복을 더디게 하고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호랑이굴에서 빠져나가려면 바짝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2주가 지나서도 소변조차 스스로 볼 수 없었다. 평생 소변줄을 끼고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우선 시급한 게 운동치료였다. 양손을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서 반창고 통이나 작은 공을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옮기는 훈련부터 시작했다. 양쪽 다리와 양쪽 손목, 손가락도 점차 펴지기 시작했다. 집중력을 갖고 연습하니 두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됐다. 한 달이 지나면서 휠체어를 탈 수도 있게 되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정도가 되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그때가 입원한 지 40여일 만이었다. 하지만 간병인이 뒤에서 잡아주어야 겨우 한 걸음씩 걷는 수준이었다.
나는 주변에서 측은하게 보는 눈길에 신경쓰지 않았다. 오로지 모든 시간을 재활에만 투자했다. 두 달여가 지나면서 혼자 서고, 부자연스럽지만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의사로서 아는 지식을 총동원한 덕택에 다행히 합병증도 막을 수 있었다.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물을 마시고, 심호흡도 신경쓰고,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해 욕창이 생기지 않게 애썼다.
후회, 분노, 자기 연민, 절망….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주리라고 믿은 적이 없다. 오직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탈출구라 믿었다.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선 소나무를 짜디짠 바닷물에 몇 년씩 절이듯, 재활 병동에서 내 몸과 마음을 외롭게 담금질했다.
그것이 효험이 있었는지 9개월 만에 내 발로 걸어 퇴원했다. 6년이 흐른 지금 나는 서울대병원 본원·분당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 3개 병원 신경과 의사 60여명의 총책인 의대 신경과학교실 주임이 됐다.
동료들은 모두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 의지와 노력도 중요했지만 사고 순간 제대로 치료가 이뤄진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만일 산에 헬기가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면…, 헬기에 목 보호대가 없어 자칫 목뼈를 다쳤더라면…, 응급실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더라면….
사실 우리나라는 국·공립병원에 의료용 헬기가 한 대도 없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헬기의 도움을 받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응급실은 도떼기시장처럼 복도까지 모두 환자로 점령돼 치료받기조차 힘들다. 미국 UCLA병원은 큰 재난에 대비해 병실을 25%만 가동한다고 한다. 만일 우리나라도 이런 병원이 있다면 무슨 낭비냐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한 장애인이 "서울시장님, 길의 턱을 없애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서울에는 여전히 턱이 많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톨스토이는 단편소설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물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돕고 살겠다는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전범석·서울대병원 신경과장
기사100자평(14)
입력 : 2010.09.20 23:30
▲ 전범석·서울대병원 신경과장
등산 가다 갑자기 쓰러졌다… 전신마비였다
친척·동료의 문병을 거부했다…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회복 위해 내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마음자세였다
"내가 중환자실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만일 살아서 나가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되는 게 아닐까?" 전신마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었다. 단지 오른쪽 엄지발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병원 병실을 돌며 환자를 진료하던 내가 옴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죽을 때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2004년 6월, 그날 나는 남한산성에 등산 갔다가 갑자기 앞으로 푹 쓰러졌다. 순간적으로 졸도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저혈압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것일까?" 몸을 추슬러 일어나려고 했지만 척추를 다쳤는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헬기부터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함께 등산하던 후배에게 휴대폰으로 119와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달라고 부탁했다. 섣불리 들것에 실려 산길을 내려가다간 더 다칠까 두려웠다. 등산이든, 교통사고든 쉽게 다칠 수 있고 위험한 부위가 바로 목뼈이기 때문이었다.
중환자실로 실려온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길까"하고 생각했다. "등산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라고 후회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우선 병과 싸우는 게 급선무였다.
▲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burbuck@chosun.com
동료들은 곧 좋아질 것처럼 위로해 주었지만, 의사인 나는 이 싸움이 한두 달 아니 몇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직감했다. 우선 친구와 동료들의 문병을 받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고 결심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마음자세였다.
부모님께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외국에 연수 갔다"고 둘러대고, 가족들도 내 뒷바라지에 힘들지 않도록 따로 간병인을 구하였다.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었다. 나 자신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나, 가족이 힘들어 하는 것은 내가 도울 수 없는 게 아닌가.
다행스럽게도 나는 내 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내 전공이었다. 앞으로 잘못되면 장애가 평생 남을 수도, 어쩌면 휠체어에 평생 의지하며 살지도 모른다. 작은 실수 하나가 회복을 더디게 하고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 호랑이굴에서 빠져나가려면 바짝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2주가 지나서도 소변조차 스스로 볼 수 없었다. 평생 소변줄을 끼고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우선 시급한 게 운동치료였다. 양손을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서 반창고 통이나 작은 공을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옮기는 훈련부터 시작했다. 양쪽 다리와 양쪽 손목, 손가락도 점차 펴지기 시작했다. 집중력을 갖고 연습하니 두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됐다. 한 달이 지나면서 휠체어를 탈 수도 있게 되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정도가 되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그때가 입원한 지 40여일 만이었다. 하지만 간병인이 뒤에서 잡아주어야 겨우 한 걸음씩 걷는 수준이었다.
나는 주변에서 측은하게 보는 눈길에 신경쓰지 않았다. 오로지 모든 시간을 재활에만 투자했다. 두 달여가 지나면서 혼자 서고, 부자연스럽지만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의사로서 아는 지식을 총동원한 덕택에 다행히 합병증도 막을 수 있었다.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물을 마시고, 심호흡도 신경쓰고,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해 욕창이 생기지 않게 애썼다.
후회, 분노, 자기 연민, 절망….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주리라고 믿은 적이 없다. 오직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탈출구라 믿었다.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선 소나무를 짜디짠 바닷물에 몇 년씩 절이듯, 재활 병동에서 내 몸과 마음을 외롭게 담금질했다.
그것이 효험이 있었는지 9개월 만에 내 발로 걸어 퇴원했다. 6년이 흐른 지금 나는 서울대병원 본원·분당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 3개 병원 신경과 의사 60여명의 총책인 의대 신경과학교실 주임이 됐다.
동료들은 모두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 의지와 노력도 중요했지만 사고 순간 제대로 치료가 이뤄진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만일 산에 헬기가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면…, 헬기에 목 보호대가 없어 자칫 목뼈를 다쳤더라면…, 응급실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더라면….
사실 우리나라는 국·공립병원에 의료용 헬기가 한 대도 없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헬기의 도움을 받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응급실은 도떼기시장처럼 복도까지 모두 환자로 점령돼 치료받기조차 힘들다. 미국 UCLA병원은 큰 재난에 대비해 병실을 25%만 가동한다고 한다. 만일 우리나라도 이런 병원이 있다면 무슨 낭비냐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한 장애인이 "서울시장님, 길의 턱을 없애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서울에는 여전히 턱이 많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톨스토이는 단편소설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물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돕고 살겠다는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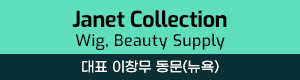

댓글목록 1
박명근님의 댓글
위기의 순간에 남에게 의지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음을 먼저 생각 했다니<br />
주위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고 본인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아름 답습니다